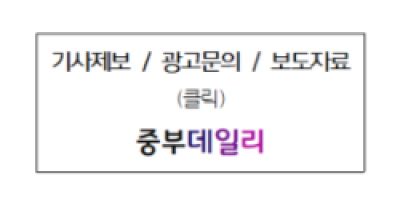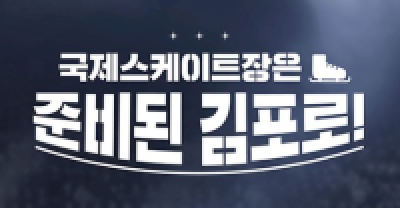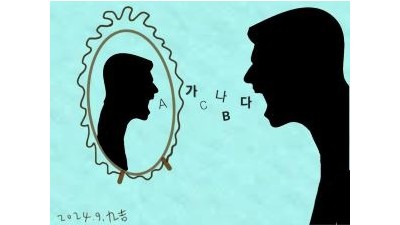애기봉 아래 조강 건너편 땅
컨텐츠 정보
본문
키가 반 뼘 밖에 오질 않던 민들레 같은 초등학생 시절, 나는 선생님 손을 잡고 김포 애기봉에 현장체험을 간 적이 있었다. 그때 내 앞에 커다란 망원경 하나가 떡 하니 자리를 지키고 있던 게 기억이 난다. 나는 호기심에 동전을 밀어 넣었고, 망원경 렌즈로 눈을 들이밀었다. 그리고 내 눈 앞에 펼쳐진 것은 그저 단순한 풍경 같은 것이 아니었다. 땅은 포장 된 아스팔트 도로가 아니라 푹신해 보이는 흙길로 덮여있었다. 또한, 내가 여태껏 보아왔던 아파트 형식의 집이 아닌 투박한 시골식 집들이 군데군데 자리를 잡고 있었다. 자동차가 달리는 모습보다 사람들이 무언가 흙을 갈며 일 하는 모습을 더 쉽게 찾아 볼 수 있었다. 그리고 그 땅과 나 사이에는 햇빛으로 반짝이는 강 하나가 길게 놓여있었다.
 | ||
이러한 모습은 나에게 풍경을 넘어서서, 새로운 세상의 발견과도 같았다. 내가 알던 세계와는 다르던 그 곳은 나에게 왠지 모를 정겨움과 반가움을 주었고, 나는 선생님께 다가가 생기 어린 눈으로 바로 말을 꺼냈다.
“선생님, 저희 강 건너편에 가보면 안 돼요? 네?”
하지만 선생님의 말씀은 나의 기대를 실망시켰다.
“지금 저 쪽으로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란다.”
나는 도저히 그 말이 이해가 가질 않았다.
‘배만 있으면 갈 수 있을 곳인데, 어째서지?’
그리고 나는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야 깨달았다. 그 새로운 세상은 바로 북한이었음을.
벌써 그 일이 있은 지도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곳은 디딜 수 없는 땅이다. 우리의 시간은 멈춰있었다. 아니, 오히려 거꾸로 흘러가는 것만 같다. 뉴스에서는 오로지 북한과의 경계태세만을 읊조리고 있다. 내심 마음속에는 불안감이라는 그림자가 스멀스멀 커지고 있다. ‘통일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며 외치던 나조차도 점점 ‘정말 꼭 해야 하나?’라며 의문을 가지기 시작했다. 북한 없이도 현재 잘 살 수 있고, 또 통일을 하면 세금도 엄청 뛸 것이고…. 나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그러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그런 모습은 결국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식’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얼마 걸리지 않았다.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정치적, 경제적, 그리고 사회적인 면 그 어디를 보더라도 통일의 필요성은 어디 하나 빠지는 것이 없다. 우선 북한과 우리가 손을 맞잡았을 때 변화된 상황을 상상해보자. 비록 경제체제를 안정시키는 데에는 다소 많은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그 시간이 지나고 나면 북한의 자원과 남한의 경제력이 합쳐져 대폭적인 성장을 할 것이다. 이 사실은 그 누구도 고개를 저을 수 없을 것이다. 또한, 지금 지출되는 분단 비용을 다른 곳에 투자할 수 있게 된다. 지금 우리나라는 군사비, 외교비 등으로만 26조원이 넘는 돈을 쓰고 있음을 아는가? 철조망을 허물고 하나가 된다면 우리는 이런 불필요한 돈을 충당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또한 군 복무의 의무가 사라져 사회적으로 더 다양한 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서로 수많은 지원을 해 주어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통일을 해야 하는 이유는 모두가 알고 있듯이, 바로 ‘분단의 아픔’이라는 녀석 때문이다.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후세에게 이산가족의 아픔을 또 다시 대물려 주어서는 안 된다. 나는 이산가족을 이리 칭하고 싶다. 여름을 기다리는 ‘매미’라고! 매미는 성충이 되어 찌르르 울기 위해 생애 전부 어두운 흙 밑에서 잠든다. 그리고는 비로소 생명이 쨍쨍 돋우는 여름이 되면 모든 한을 다 맴맴 울며 토해내는 것이다. 나는 그런 점이 이산가족과도 닮아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들에게 아직 여름은 오지 않았다. 아직도 어두운 흙 안에서 아픔을 견디고 있다. 우리는 그 매미를 위해서라도 생명으로 가득 찬 여름을 피워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여름이 되면 그들의 울음소리로 한반도가 가득 차게 말이다.
그리스 로마 신화 중에 이런 이야기가 있다. 성별이 나뉜 이유에 대한 얘기였는데, 본디 사람은 성이 나뉘지 않은 하나의 완전체였다고 한다. 하지만 그렇게 되자 인간이 너무 완벽해보여 질투를 한 제우스신이 사람들을 둘로 쪼개버렸다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남자와 여자가 된 것이고, 그 후로 지금까지 서로를 그리워한다는 이야기이다. 나는 이 신화를 듣자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다. ‘아! 이게 혹시 남북의 모습은 아닐까?’ 반세기 넘게 둘로 쪼개져 지내오고 있는 지금 우리의 모습과 너무도 닮아있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가 또 다시 하나가 되는 것은 이 신화같이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니다. 화해라는 것이 코 닿을 거리에 있는 것이라면, 그저 손을 맞잡으면 되는 일이다. 60년간의 공백이 주는 거리감은 그저 시간에 맡기면 되는 일이다.
이러함에도 우리가 명심해야 하는 점은 분명 한 가지 있다. 우리는 수평적인 관계지, 수직적인 관계가 아니란 점이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대화가 가능하듯, 결코 무력 통일 등의 강압적인 방법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그 눈높이를 맞추는 일이다.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느냐, 안 맞추어야 하느냐가 아니다. 결국 통일을 해야 하느냐, 안 해야 하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이다. 박수도 손바닥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말이다.
‘죽은 시인들의 사회’라는 영화 중에 이러한 말이 하나 있다.
“어떤 사실을 안다고 생각 할 땐 그것을 다른 시각에서 봐라. 틀리고 바보 같은 일일지라도 시도를 해봐야 해.”
나는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해주고 싶다. 비록 누군가에게 통일은 꺼려지는 일일지도 모른다. 어떤 사람은 그것에 대해 충분히 안다고 생각 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이것을 다른 시각에서도 볼 줄 알아야 한다. 어떤 면에서는 사회에 혼란을 주는 존재일 수도 있지만, 영원히 변치 않는 것은 그 안에는 이산가족의 뼈에 사무치는 슬픔이 있고, 부정 할 수 없는 한 민족의 얼이 있다는 사실이다. 나는 아직도 그 10년 전 올라갔던 애기봉을 가끔씩 아빠와 손을 잡고 올라가보곤 한다. 예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맞은편의 북한 땅은 아직도 나에게 꿈의 세상으로 남아있다. 이제는 더 이상 전망대의 도움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발 스스로 그 땅을 밟아보고 싶다. 그리곤 ‘반갑다, 우리 땅!’이라고 외치고 싶다. 그런 날이 하루 빨리 오기를 나는 오늘도 꿈을 꾸어본다.
 | ||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