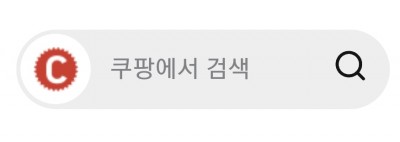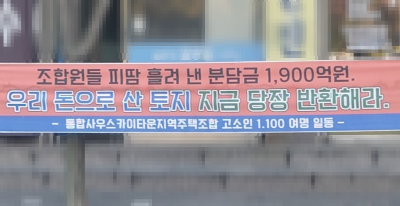[임종광의 서포만필] 귀남(貴男)이 되던 날
컨텐츠 정보
본문
간밤에 내렸던 비 탓인지 깨끗하게 세수를 한 지붕과 나무들이 청담의 하늘과 함께 산뜻한 조화를 이루고 있는 정말 좋은 아침 나절이다.
지금이야 내리는 비가 운치 있고 더러는 낭만적일 때가 있긴 하지만 내가 어렸을 적엔 왜 그렇게 비 오는 날이 싫었고 원망스러웠는지 모른다.
시골 출신인 나는 5형제 중 넷째다.
모두가 세 살 터울이었던 우리 집은 비만 내렸다 하면 우산전쟁을 치르곤 했었는데 첫째 둘째형에 대한 어머니의 편애는 하찮은 우산에서까지 철저히 기득권 행사를 했고 동생과 나에겐 헤지고 살이 부러진 비닐우산조차도 감지덕지해 하며 그렇게 비오는 날을 맞이하고는 했다.
내리 아들만 다섯을 낳으신 어머니께서는 일명 후남이들인 나와 동생은 형제간에 이질감을 느끼게 할 정도로 흔히 말하는 뒷전 그 자체였다.
물론 이러한 생각들은 차차 나이가 들면서 싹 잊었지만 어른이 된 지금까지 기억 저편에 생생히 남아있는 추억은 그날의 어머니 모습이다.
그날은 새벽부터 제법 굵은 비가 내렸던 초여름이었다.
난 그때 초등학교 1학년이었고 하필이면 홍역을 앓고 있었다.
그래도 학교만큼은 죽어라 가야겠기에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는 등 내 딴에는 학교 갈 채비를 서둘렀다.
이런 내 모습을 보고 봉당 한 모서리 닭장에서 닭 모이를 주시던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다.
"몸에 열도 많고 비도오고 하니깐 오늘은 학교 가지 말고 그냥 집에 있거라. 쓰고 갈 우산도 없고..."
어린 마음에도 학교에 가지 말고 집에 있으라는 어머니 말씀이 솔직히 배려라는 생각이 들지 않았다. 그저 귀에 거슬릴 뿐이었다.
나는 어머니께서 잠시 우물가를 가신 틈을 타 잽싸게 집을 빠져나왔다.
월곶 개곡리에서 면 소재지가 있는 군하리까지 족히 4km가 넘는 학교가 평소엔 퍽 멀게 느껴졌지만 혹 어머니가 뒤따라오시면 어쩌나 하는 불안감 때문이었는지 열꽃이 든 아픈 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바람처럼 그 빗속을 정신없이 달렸다.
비에 젖은 생쥐 모습의 내 초라한 몰골이 부끄럽고 창피하다기보다는 일단은 학교에 왔다는 안도감은 나로 하여금 우쭐거림 같은 자부심과 뿌듯함을 느끼게 해 주었다.
4시간의 오전수업이 끝나도록 내 마음을 알 길 없는 하늘에선 여전히 줄기차게 비가 내리고 있었다.
같은 방향의 친구가 청소를 마칠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데...
허름한 몸빼바지에 고무신을 신고 머리엔 수건을 두르신 어머니께서 교실 창문 맞은편에 서 계시는 게 아닌가. 역시 손에는 낡은 우산을 드신 채.
난 십리 길을 걸어오신 어머니가 반갑기보다는 "왜 가지 말라는 학교엘 갔느냐"며 행여 면박이라도 주시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앞섰다.
그러나 내 생각은 한낱 기우에 지나지 않았다. 어머니의 어설픈 연기가 한눈에 들어왔기 때문이다.
‘이 엄마가 우산을 갖고 왔노라’는 제스처로 높이 우산을 들어 보이시더니 박꽃처럼 수줍게 웃는 것이 아닌가.
그제서야 내 얼굴에도 작은 박꽃들이 줄줄이 피고 있었다.
그날 어머니는 나를 등에 업고는 책과 필통이 든 보따리 가방을 꼬부랑 지팡이 모양을 한 우산 손잡이에 감았다.
아랫목보다 더 따뜻한 어머니의 체온을 내 작은 가슴으로 다 알기엔 너무 크고 벅찼다.
아들 부자집에서 아들만 다섯을 낳으셔서 호랑이 할머니로부터 고된 시집살이를 살아오신 어머니.
어머니께서는 종종 이렇게 말씀하시곤 하셨다.
"손가락 다섯 깨물어 안 아픈 게 없어. 자식은 다 같은 내 새끼들이야. 잘 먹이고 잘 입히고 잘 가르쳐야지."
*글 = 임종광 김포우리병원 기획관리실장. 한국농민문학 수필 신인상 당선 작가. 그림 = 최구길.
"이런 어머니께서 오래전 작고하셨습니다. 참 고생도 많이 하신 어머니. 칠순잔치를 잘 해드리려 했는데... 그것도 자식들에게 폐 끼치실까봐 그러셨는지 칠순 3개월을 남겨놓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시고는 다시는 눈을 뜨시지 않으셨습니다." - 작가의 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