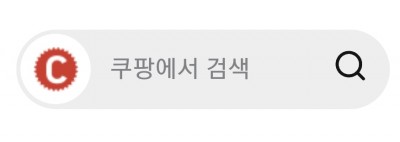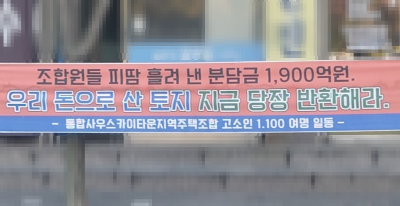[섬기행] 이맘때 딱 섬티아고 소청도
컨텐츠 정보
본문
뭍 보다 계절이 늦장을 부리며 찾아오는 10월 말 소청도는 이제사 가을이다.
27일, 28일 이틀 간 시민과학자와 함께하는 글로벌에코투어연구소 생태기행단이 소청도에 발을 딛었다.
소청도는 새와 달래, 부추, 들갓, 꽃게, 우럭, 삼치, 홍합, 물범의 섬이다. 파도와 바람도 빼놓을 수 없다.
소청도에는 서해5도에 서식하는 철새의 생태와 이동경로의 종합 연구를 수행하는 국가철새연구센터가 2019년 4월 문을 열었다.
또한 최근 사단법인 조류충돌방지협회의 조류충돌테스트센터도 들어서며 새 연구의 핵심 지역으로 떠오르고 있다.
우리나라에는 550여 종의 새가 있고 그 중 소청도 인근에서 350여 종이 관찰된다.
이맘때 소청도에서는 150여 종의 새를 볼 수 있는데 체류 기간 동안 바람이 많이 불어서인지 까마귀와 직박구리 정도만이 관찰 됐다.
조류충돌테스트센터에 의하면 가을철 센터에서는 멧새와 딱새류 등 작은 종들이 주로 발견되고 있다고 했다.
일행은 인천연안여객터미널에서 오전 8시 30분 배를 타고 12시 정오쯤 소청도 탑동포구에 내렸다.
10여 분을 걸어 소청1리 예동마을 이성만 전 이장이 운영하는 다희민박에 짐을 풀었다.
3시간 30여 분간 배를 타고 왔고 나름 깔딱 고개도 넘어온 터라 허기진 일행에게 주인장은 톳비빔밥을 내줬다.
식감 적절한 톳에 조선간장을 흩뿌려 비비니 입맛이 돋았다. 서해 진미 미역국에 감칠맛 백김치와 깎두기도 달큰했다.
잠시 짐을 정리한 일행은 소청2리 노화동 쪽으로 산을 오르기 시작했다.
소청교회를 지나 조금 더 가면 순백색의 김대건 안드레아 신부상이 바다를 바라보고 있다.
김대건 전신상은 1961년 부영발 신부의 노력으로 세워졌다.
국내에서 포교활동을 하던 김대건 신부는 1846년 5월 순위도에서 관헌에 붙잡혀 그해 9월 새남터에서 참수됐다.
'1846년(헌종12) 4월18일 중국과 연락차 연평도를 경유하여 소청도를 거쳐 백령도로 해서 중국 어선에게 송신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
김대건 전신상 바로 옆은 100여 년이 넘은 동백나무군락지다. 깎아지는 언덕에 한몸인냥 붙어 있는 동백이 절묘하다.
두어시간 크고 작은 고개를 너덧 개쯤 넘으면 절벽같은 언덕 샛길을 따라 확 트인 망망 서해를 바라보며 걷는 섬티아고길이 나온다.
이날 바람이 어찌나 세게 부는지 무섭기도했지만 가슴 속 침잠해 있던 감정과 기억들이 송두리째 하늘로 날아가 버렸다.
대청도 서풍받이와는 분명 또 다른 절경이다.
좀 더 걷다 보면 길을 중심으로 한 쪽에서는 ’쑤아아아‘ 파도소리가 다른 한 쪽에서는 ’후우우엉‘ 바람소리가 서로의 기세를 겨룬다.
이윽고 바다 끝단 언덕 위에 서 있는 소청도 등대가 눈에 들어온다.
당초 일행은 첫날 분바위를 가려고 했으나 물때가 안 맞아 일정을 바꿔 등대부터 방문을 했다.
이곳에 등대가 세워진 건 1908년이다. 우리나라에서 1903년 팔미도등대 이후 두 번째로 지어진 근대적 등대다.
일본이 조선을 강제병합하기 전 고래잡이 등 어족자원 수탈과 중국 침략을 위해 설치했다.
현재의 등대는 다시 지은 것이다.
망원경으로 바다를 바라보던 김보경 가톨릭환경연대 사무국장이 소리쳤다.
“어, 점박이물범이다!”
일행의 눈이 일제히 바다로 향했다.
한 마리가 머리를 내밀고 숨을 고르고 있었다.
이윽고 배를 하늘로 하고 물 위에 떠있는 녀석까지 4마리 정도가 관찰됐다.
일행은 한참동안 물범의 움직임에서 눈을 떼지 못했다.
이어 노화동해변으로 이동한 일행은 씨글라스(Seaglass)를 채집했다.
씨글라스는 깨진 병 등 유리가 파도와 자갈, 모래와 부딪혀 마모 된 것을 말한다.
깨진 유리는 위험하지만 씨글라스는 색도 예쁘고 부딪히면 영롱한 소리를 내 바다의 보석으로 불린다. 최근 환경 공예 소재로 많이 활용되고 있다.
소청도는 또 마을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1리, 2리 두 곳에 모여 사는데 1리 예동(禮洞)은 말 그대로 예가 있는 마을이란 뜻이다.
지나던 상선이나 표류해온 선박이 정박하면 예를 갖춰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었다 하여 예동이다.
2리 노화동(蘆花洞)은 예부터 갈대가 무성했다 하여 갈대꽃 마을 노화동으로 불린다.
숙소로 돌아온 일행은 이 전 회장님이 전날 잡아온 삼치회에 뭍에서 사온 삼겹살로 저녁을 마치고 잠자리에 들었다.
이어 이른 기상과 함께 꽃게라면으로 배를 데운 뒤 물때를 맞춰 아침 8시에 분바위로 향했다.
분바위는 바다와 접한 곳이어서 물때를 맞추지 못하면 접근이 불가하다.
또 겨울이면 분바위 안내소까지 접근이 안 된다. 가는 길이 경사가 하도 심해 너무 위험하기 때문이다.
나머지 철에도 4륜구동 SUV 차량이 아니면 안내소까지 갈 수가 없다. 그 경사를 승용차나 일반 차가 도무지 감당할 수가 없어서다.
"분바위는 분처럼 하얗습니다. 먼 바다에서도 달빛에 반짝거려 자연등대의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월띠라고도 합니다. 멀리서 보면 달 띠 모양으로 빛나니까요."
분바위 지질공원 안내소에 모인 일행은 해설사의 설명과 함께 곧장 분바위로 향했다.
“햐아!”
“우와!”
여기저기 감탄사가 터졌다.
계단을 오르다 다시 내려가는 계단을 만나자 바위로 된 무대 세트 위에 탁 트인 바다가 반겼다.
설렘을 안고 계단을 내려간 일행 앞에는 일출과 함께 파노라마 바위의 장관이 펼쳐졌다.
새카만 홍합밭 양탄자를 밟고 바라본 새하얀 분바위는 생경했다. 사진으로 볼 때와는 또 다른 10억 년의 화석을 대하는 감흥이었다.
사실 소청도는 조선대륙이 아니다.
백령도와 대청도, 연평도, 강화도, 월미도, 덕적도 등 서해와 남해의 모든 섬들은 만주에서 뻗어나온 조선대륙의 일부가 바다에 잠겨 있는 것이지만 소청도는 다르다.
소청도는 호주대륙의 일부였으나 떨어져 나온 뒤 조금씩 북향에 지금의 바다에 자리를 잡은 거대한 스트로마톨라이트(stromatolite) 바위섬이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바다나 호수 등에 서식하는 남조류나 남조박테리아 등의 군체들이 만든 화석으로 석회암의 일종이다.
분바위처럼 새하얗거나 이른바 현지 주민들이 굴껍데기 같다 하여 ’굴딱지돌‘이라고 불리는 바위에 색색의 무지개 빛깔을 내는 대리석까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난다.
섬 전체가 대리석이다 보니 일제강점기부터 1970년대까지 8곳의 광산이 운영됐고 지금도 그 흔적이 곳곳에 있다.
백령·대청·소청도는 지질 유산이 워낙 풍부하고 동아시아 지각의 진화 과정을 밝힐 수 있는 단서를 품고 있어 2019년 7월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됐다.
인천시는 현재 백령·대청 국가지질공원의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 선정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들도 우려 보다는 좀더 세계를 향해 지역을 알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들을 하고 있다.
소청도는 1박2일로는 짧다. 2박3일 정도는 일정을 잡아야 트레킹에 해변 감상에 또는 낚시까지 여유를 부릴 수 있다.
등대와 분바위 외에도 작은삭금, 큰삭금, 햇마루, 아진포구, 우무지 등 작은 듯 하지만 갈 곳 많아서 더 아쉬움이 남는 섬이다.
특히 놀라운 것은 달래, 부추, 들갓이다.
농담이 아니고 산이든 들이든 길이든 집 근처든 보이는 풀이면 거의 모두가 달래, 부추, 들갓이다.
양념만 가져가면 바로 버무리면 될 정도니 푸성귀 걱정이 없는 섬이다.
짧은 일정이 못내 아쉽지만 사시 중 삼철이 남았으니 다시 또 올 생각에 벌써부터 설렌다.
글·사진 최구길 기자
#섬티아고 #소청도 #여행 #탐방 #낚시 #트레킹 #등대 #분바위 #스트로마톨라이트 #에코투어 #연구소